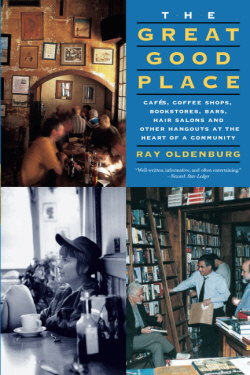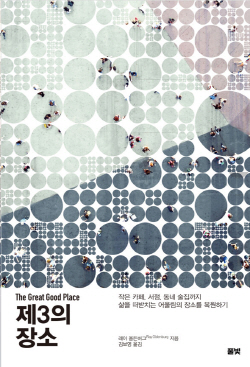|
|
미국의 도시사회학자인 웨스트 플로리다대학교 명예교수 레이 올든버그(Ray Oldenburg, 1932~ )의 《제3의 장소》(The Great Good Place)는 제1의 장소인 가정, 제2의 장소인 일터 혹은 학교에 이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리는 장소의 중요성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의 메시지는 '사람은 가정이나 학교(일터)에서 주어지는 사회적 역할만으로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 삶을 떠받칠 제3의 장소가 필요하다. 삶의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거의 의식하지는 못했던 '장소'의 사회적 가치를 발굴해 냈다'로 요약된다.
많은 이들이 제3의 장소라는 개념을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그 중요성과 쓸모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가정과 학교(일터)라는 두 디딤대만을 의지해 아슬아슬하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절실했던 부분일 것이다. 이 책은 '현대인이 앓고 있는 상실감, 고독감 같은 문제들의 원인이 제3의 장소의 쇠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면서, 제3의 장소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불편을 느끼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회를 거부하는 시민'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디가 제3의 장소인가? '기대 반 실망 반'으로 묻는다. 우리에게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가. 어떤 이는 '제3의 장소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단지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알아차리느냐가 숙제로 남아 있을 뿐'이라고도 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은 거리로 나가 스스로 다른 아이들과 놀았다. 그럴 만한 공간도 있었고, 한동네 주민들은 하나같이 아이들을 지켜보는 '눈'이 되어주었다. 보호자는 아이들이 잠시 보이지 않더라도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고, 다른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과거에는 이들이 서로를 돌볼 수 있었던 반면에, 현대 사회는 노인이나 아이 등 약자를 돌봄이 필요한 수혜자로 일찍 전락시켰다. 적절한 제3의 장소가 있었다면 사람들은 서로를 챙길 것이고, 이는 그 어떤 복지제도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렇지 않다면 공동체적 삶의 배신이 드러나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교류는 그 지역의 장래성, 잠재력과 지적 호기심 등으로 다양하게 이어질 것이다. 생각을 확장시키고, 체험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재인식시키는 데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나는 오랫동안 '박물관'이 '제3의 장소'로 기능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믿어왔다.
박물관의 주제는 일반적으로 통사(通史)든, 분야사(分野史)든, '역사'이다. 그곳에서 우리의 '오늘'을 깨닫게 된다면 큰 다행이자 훌륭한 성과일 것이다. 제대로 기록하고, 보존하고, 재현되는 '역사의 길'에 서면, 자신의 존재감이 책임감으로 변하여, 마침내 소중한 정의감을 느끼고 간직하는 곳은 바로 박물관이어야 맞다. 바른 역사가 커가는 이 선순환(virtuous circle) 구조를 잊어 버려서는 안 된다. 박물관을 그냥 '문화공간', '관광자원'으로만 퉁 치기엔 너무나도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어느 사이 유행이 변하고 콘셉트가 바뀐다는 말이 실감 나는 건 박물관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박물관이 진화한다는 이야기도 그냥 받아들이기에 만만치 않다. 오랜 시간의 켜를 쌓아오면서, '눈으로 보는(Eyes On) 박물관'에서 '체험하는(Hands On) 박물관'으로, '이해하는(Minds On) 박물관'으로, '느끼는(Feels On) 박물관'으로, 이른바 '대중교육시대'의 주요 공간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크게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기가 그지없다.
덧붙인다면, 새로운 감성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도 필요하고, 모두가 우려하는 가짜뉴스도 가려내고, 거부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한다. 세대공감을 통해, 동서양의 인식과 세계의 트렌드를 알게 하는 많은 준비도 필요하다. 다문화를 생각하면서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us)라는 꽤나 희망적이고 점잖은 신인류를 맞을 채비도 해야 한다. 그리고 늘 우리를 짓누르는 '사회적 가난'인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에 태무심한 것도 큰 문제다. 이 많은 것들을 유연하게 드러내 해법을 찾는 곳이 바로 '제3의 장소'인 것만은 분명할 것 같다.
어떻게 모두를 알아차리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오랜 시간 스며든 많은 '박물관'이 진정한 의미의 '제3의 장소'인지를.
/전 대구교육박물관장
김정학 전 대구교육박물관장은…
영남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미국 현대희곡을 공부했다. 대학 졸업 후, 한국과 미국 등에서 20년간 방송사 프로듀서로 지냈다. 최근 13년간은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총감독, 국악방송 제작부장 겸 한류정보센터장, 구미시문화예술회관장 등을 거쳤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대구교육박물관장을 지냈으며, 현재 대구어린이세상 관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일연선사로 팔만대장경을 본다』(1998), 『박물관에서 무릎을 치다』(2020)가 있으며, 옮긴 작품으로 샌디 바우처의 소설 『숨어 있는 샘(Hidden Spring)』(2010)과 대구시립극단이 2019년 무대에 올린 아서 밀러의 희곡 『크루서블(The Crucible)』이 있다.